자선냄비운동의 사회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Historic Meaning of the Christmas Kettle Movement
참령 강 종 권
1. 들말 : 종교사회학적 상징으로서의 자선냄비
2. 사회변동과 구세군의 사회봉사
3. 한국 구세군 자선냄비의 사회사적 의미
4. 날말 : 자선냄비 운동의 다양한 형태와 사회적 기대
1. 들말 : 종교사회학적 상징으로서의 자선냄비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있다. 하나는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롤송이고 또 하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크리스마스트리의 불빛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빨간 구세군자선냄비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동시에 ‘어느덧 연말이구나!’라는 감상에 빠져들게 한다. 특히 구세군자선냄비는 눈을 즐겁게 하고 괜스레 마음을 들뜨게 하는 캐롤송과 크리스마스트리와는 달리 마음을 엄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종교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지닌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김준철 부정령은 자선냄비의 의미를 사회학적, 신학적, 성례전적 의미로 구분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 세상의 한 복판에서 성례전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말은 자선냄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를 꾸미기 위한 장식으로서의 풍경이나, 한 해가 저물어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세모(歲暮)의 전령으로서만 아니라 변동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불행과 아픔을 보듬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신앙적 정신의 발로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모금을 위한 모금을 뛰어 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자는 종교사회학적 상징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징이란 현실 속에서 자리한 ‘궁극적 가치’를 말한다. 초경험 세계의 믿음, 문화 전통의 가치, 의미 문제 등을 포함하는 신념체계가 모두 이 속에 들어 있다. 그래서 상징은 삶의 의미와 지향성 및 목적의식을 주어 행위의 목적을 설정케 하고 이에 대한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근원의 힘이다. 아래의 글이 그 의미를 분명히 해 준다.
쌀쌀한 겨울, 무언가 따뜻한 것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구세군의 자선냄비이다.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참 초라하게도 보인다. 붉은 칠을 한 엉성한 냄비, 그리고 손이 아프게 종을 흔들며 치는 구세군의 모습, 이렇게 눈 코 뜰 새 없이 바삐 변해가는 세상에서 그들만은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를 않는다.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몇 해가 되었을까?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모습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그 빨간 자선냄비만 보면 평소엔 인색한 나도 매년 주머니 열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수많은 양식의 모금에도 쉬 응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닫아걸고 살아가던 나도 구세군의 빨간 냄비만 바라보면 어느새 마을을 열어버리고 만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닌 신뢰의 힘이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내가 그들을 믿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몇 개나 되는 것일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아직은 버리지 않은 꿈이 있다. 그 꿈을 위해서는 내 힘든 노력의 산물을 기꺼이 조금은 나눌 의사가 있다. 나에게 그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구세군의 빨간냄비인 것이다…… 이 겨울, 나는 그 굳은 얼굴로 서 있는 군인들이 생각이 난다. 진정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서고 싶고, 그래서 내 신뢰를 듬뿍 담은 손길을 기꺼이 뻗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나는 내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들에게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종교사회학적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선냄비 운동이 사회사적으로 끼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려는 작업이다. 특히 변동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사회봉사의 기능을 감당했는지, 한국 사회에서 그 기능이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선냄비 운동의 형태가 변동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대처하고 사회적 기대를 갖게 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사회변동과 구세군의 사회봉사
2.1 기독교사회주의의 실천으로서의 구세군 사회봉사
구세군의 사회봉사는 사회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회변동이란 사회구조와 사회관계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원인은 다양한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리적 환경과 인구의 변동, 이데올로기, 발견과 발명과 전파와 같은 문화 혁신, 집합행동이나 사회운동과 같은 인간행동,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발달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변동은 모든 사회에서, 모든 시기에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변동의 속도는 물리적 환경(환경변화 및 도시화), 인구변화(인구이동의 규모와 분포), 고립과 접촉(문화적 접촉 정도), 사회문화구조(통합 및 구조화 정도), 태도와 가치(전통주의, 자유주의 정도), 변화에의 요구(지식 및 기술에의 요구), 문화적 기초(지식, 기술의 축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세군의 모든 사회봉사는 변화하는 사회의 기대에 응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가 구세군을 창립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부스가 구세군 활동을 시작했을 19세기 영국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 있었는데, 1760년대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급격한 인구이동은 도시를 확장 또는 급조하여 노동자문제와 도시 빈민문제를 낳았다.
특히 1811년 영국의 중부와 북부 섬유공업지대에서 일어난 러다이트운동(Luddite Movement)은 산업혁명 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실업의 원인을 기계 때문이라고 여기고 일어난 기계파괴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시대 영국의 노동운동은 그 이후 일어난 모든 노동운동의 모체가 되었다. 특히 1836년부터 시작된 차티스트운동(Chartist Movement)이 1848년 막스의 공산당 선언과 맞물려 노동자들이 사회주의화 되어갈 때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 모오리스(Frederick. D. Maurice)는 “사회주의자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기독교인은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 기독교만이 사회주의의 유일한 토대이며, 참된 사회주의는 건전한 기독교의 필연적 결과이다. 사회주의자의 표어는 ‘협동’(Co-operation)이며, 반사회주의자의 표어는 ‘경쟁’(Competition)이다.”라고 외치며 ‘비사회적인 기독교인’(Unsocial Christians)과 충돌하고, ‘비기독교적인 사회주의자’(Unchrist- ian Socialists)들과의 충돌을 외치면서 교회와 기독교로부터 접촉점을 잃어버리고 고립되어버린 노동자들을 위해 기독교사회주의를 실천해나갔다.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은 이와 같은 사회변동에 응답한 결과이다. 노동운동으로 얼룩진 영국사회에 만연한 도시빈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기독교사회주의를 실천한 것이 구세군의 사회봉사이다. 실제로 윌리엄 부스가 1890년 최암흑의 영국과 출로(In Darkest England & the Way Out)를 저술하여 계획하고 제안했던 것도 기독교사회주의적인 구세군 사회봉사의 일환이었는데, 토마스 헉슬리(Thomas H. Huxley)가 부스의 이 계획을 가리켜 “위장된 사회주의이며, 신학적 표피에 가려진 전제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것이 그 단적인 증거가 된다.
2.2 전인구원을 위한 사역으로서의 구세군 사회봉사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구세군의 모든 사회봉사가 변화하는 사회의 모든 기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대처하느냐라는 것이다. 구세군은 이 점에 대하여 단체의 명칭과 같이 ‘구원’(Salvation)이라는 용어로 응답하고 끊임없이 ‘사회구원’(Social Salvati- on)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윌리엄 부스가 “우리는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상태를 지속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특성입니다”라고 말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선교회라는 이름을 구세군으로 바꾼 것도 이 한 가지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구세군은 모든 사회의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봉사의 손길을 내민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위한 복음을 바탕으로 하는 총체적인 사역의 일부분으로 이해되고, 행해지고,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최암흑의 영국과 그 출로에서 보여주는 윌리엄 부스의 구원론, 즉 구세군이 행하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은 개인의 구원과 동시에 사회를 구원하려는 는 이중적인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세군이 행하는 사회봉사가 처음부터 변화하는 사회의 모든 기대에 응답하는 구원의 행위라고 할 때 구세군이 행하는 자선냄비의 성격이 단순히 구제를 위한 모금행위가 아니라 이 땅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한 전인구원의 사역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3 1893년 경제공황과 최초의 자선냄비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1891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의 항구에서 시작되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배 한척이 파선되어 난민이 생겼지만 시 당국은 그들을 구제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은 철도의 확장과 지나친 투자로 경제공황이 일어나 경제가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생긴 난민과 경제공황으로 생겨난 빈민들을 안타까이 여기던 조셉 맥피 정위(Captain, Joseph McFee)는 1000명을 위한 크리스마스 만찬을 계획하였다. 이전에 선원이었던 맥피는 그가 리버풀 항구에서 보았던 배를 생각하고 1891년 12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항구로 달려가 선원들이 사용하는 ‘심슨 포트’(Simpson's pot)라고 불리는 큰 냄비를 가져다가 거리에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이 냄비를 채우십시오”라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모금한 돈으로 맥피는 계획한대로 1000명의 난민과 빈민에게 크리스마스 만찬을 베풀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전 세계의 모든 구세군이 자선냄비를 통해 불우한 이웃을 구호하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자선냄비를 왜 크리스마스 시즌에 실시하는지 그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오클랜드에서 실시되었던 그 사회봉사가 1000명의 난민과 빈민을 위한 크리스마스 만찬을 베풀기 위해 행하였다는데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선냄비를 ‘Charity Pot’라고 하지 않고 ‘Christmas Kettle’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의 경제공황과 인민당 사건 등의 거대한 미국의 사회변동의 위기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게 봉사하기 위한 구세군의 응답이 자선냄비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시작된 자선냄비는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떤 사회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3. 한국 구세군 자선냄비의 사회사적 의미
3.1 근대 한국의 사회변동과 일제의 식민정책
근대 한국 사회는 대체로 5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기는 개화기로 1875년 운요호(雲楊號) 사건으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때부터 1896년 개화파 내각에 의해 근대화 개혁이 추진되었던 1896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유교 조선의 쇠락과 함께 인민이 눈을 뜨던 시기로 조선의 자주를 위해 민족주의가 기지개를 펴던 시기이다. 제 2기는 기독교민족운동기로 1896년 독립협회운동에서부터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제에 의해 ‘조선의 보호’라는 명목 아래 조선의 자주권과 외교권이 빼앗겨버린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졌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미국이나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기독교인 되었던 서재필, 윤치호 등의 개화파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자생하여 기독교인들이 되었던 서북지방의 인민들에 의해 새로운 민족운동인 ‘기독교민족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제 3기는 잠재기로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국권을 통째로 빼앗아 무단통치를 펼쳐 집회결사와 언론의 자유를 빼앗긴 조선은 숨죽여 살면서 1919년까지 기독교공동체를 중심으로 독립을 위한 집합행동의 역량을 키워오던 시기이다. 그래서 1919년 3ㆍ1운동은 기독교적인 모든 집합행동의 역량이 그대로 표출된 운동이다. 제 4기는 수탈기로 1920년부터 1937년 일제가 노구교사건(蘆溝橋事件)으로 중일전쟁을 일으킨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일제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수정한 소위 ‘문화정책’을 펼쳐 조선인의 집회결사와 언론통제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산미증산계획 등으로 조선의 경제를 철저하게 수탈한 시기이다. 마지막 5기는 암흑기로 1937년 중일전쟁에서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이 시기에 일제는 조선인의 말과 이름과 정신을 빼앗아 일제의 전쟁 동원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이다.
조선에서 자선냄비를 시작하였던 1928년은 식민지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이다. 1910년대 토지조사와 회사령 공포로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고 민족자본을 말살하였던 일제는 1920년대 들어 기만적인 문화정치를 펼치며 한편에서는 산미증식계획과 회사령 철폐 등으로 식민지 조선을 철저하게 수탈하였다.
1918년 일본 곳곳에서 쌀을 요구하는 일제의 폭동이 일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제는 전쟁물자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일시적인 식량부족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에 일제는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확보할 목적으로 산미증식계획을 세웠다.
일제는 토지를 개량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쌀 생산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2억 3620만 원을 들여 42만 7200정보를 개량하고, 영농방법을 개선하여 899만 5000석을 더 생산하고 그 가운데 800만석을 일본으로 가져간다는 계획이었다. 일제는 이 계획에 지주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이 기간 동안 토지개량과 수리시설 정비는 일본인 대농장 회사가 국유미간지나 간석지 등을 불하받은 뒤 조선 농민을 동원하여 개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개간에 참여한 조선 농민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소작료를 면제하고 소유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개간이 끝난 뒤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대다수였다.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각지에 수리조합을 설치하고 농민들을 가입시켜 저수지를 만들고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리조합비가 지나치게 많아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농민들은 땅을 팔고 소작농으로 몰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미증산계획이 진행되면서 소작농민에 대한 수탈은 점점 강화되었다. 지주들은 자신들이 물어야 할 수리조합비를 소작농민에게 떠넘기었고, 농사개량을 구실로 개량 농구나 금비 사용을 강요하여 농민부담을 가중시켰다. 소작농민과 자소작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작료를 물고 나면 그 해 겨울은커녕 당장 때울 끼니가 걱정이었다. 춘궁기를 넘기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지주나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의 돈을 빌려 써야했고, 따라서 농민들은 고향을 등지거나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기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수출시장이 줄어들면서 불황에 휩싸인 일제 자본은 식민지 수탈을 통해서 경제 불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1912년에 공포했던 ‘회사령’을 1920년에 철폐하여 일본 자본이 조선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또한 일제는 1923년에는 다른 나라 상품에는 관세장벽을 쌓는 대신에 일본 상품의 조선 진출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여 제1차 세계대전 뒤 벽에 부딪힌 상품수출의 길을 확대해 주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 조선에 들어온 상품인 직물과 의류, 기계 등은 가득이나 기반이 취약한 조선의 공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밖에도 일제는 1927년 신은행령을 발표하여 조선인 소유 은행을 강제로 합병하여 조선은행에 예속시키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강화되고 노동자와 농민 등 인민 수탈이 심화될수록 조선 인민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어려워졌다. 노동자의 수는 1921년 4만 9000명에서 1928년에 9만 9000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짐꾼, 하역인부, 토목공사인부, 광부 등 자유노동자를 더하면 전체 노동자수는 약 100만여 명을 헤아려 1920년대 노동운동이 발전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가운데 나이 어린 노동자가 7.5%를 차지하였고, 여성 노동자도 35%나 되어, 노동자의 구성면에서 초기 자본주의 단계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임금은 같은 조건의 일을 하는 일본인의 절반도 되지 않는 민족적 차별을 받으면서 도시빈민이 되거나 걸인이 되었다.
1926년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세궁민(細窮民)이 총인구의 약 11%인 215만 명이었고, 걸인이 1만 명이었다. 1931년 통계에 의하면 세궁민이 약 520만 명으로 총인구의 25%로 증가했고, 걸인의 수도 16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겨울에 동사자도 속출하였다.
3.2 위기의 조선에서 위기의 구세군이 결단한 자선냄비
조선에서 시작된 자선냄비운동은 이와 같은 열악한 식민지 사회에 응답한 사회봉사의 결단이었다. 특히 이 시기의 결단은 1926년 분규사건으로 인해 한껏 사기가 꺾인 조선 구세군에게는 대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일대 모험일 수도 있었다.
1926년 11월에 시작된 분규사건은 이듬해 1월 7일 조선 구세군 사령관 두영서 참장(Lieut-Commissioner, James Toft)의 「구세군 분규사건에 대한 그 진상을 말함」이라는 성명서 발표로 표면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대단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던 사건이었다. 예를 들어 먼저, 1908년 구세군이 조선에서 개전 한 이래로 겨울 구호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 사건으로 구호를 위한 기부금이 상당히 결손되어 구호사업을 위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 두 번째로 1910년부터 시작된 극기모금이 1927년에는 최악으로 저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관이 많이 면직되었고, 사관학생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구셰공보 <금주호> 판매가 저조하였다. 6만부를 인쇄했지만, 각 지역관들의 주문과 판매가 지난 몇 해 동안의 노력에 미치지 못하였고, 몇 몇 사관들은 대중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했다. 그 이유는 분규사건이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가 1926년 11월 7일부터 시작하여 분규사건이 표면상 종결 된 이후인 1927년 2월 28일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44명의 사관들이 면직되고 28명의 사관학생들이 퇴학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세도 1925년 8,509명의 신도가 1927년에는 3,396명으로 급감하여 사관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구세군이 계획대로 자선냄비운동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시기적으로 분규사건의 진통이 일 년 정도 지나면서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1928년 극기헌금은 조선 인민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전년에 비해 2,150전이 증가한 13, 450엔 95전이었고, 금주호 판매도 1927년에는 60,000부를 발행하여 칠 천부 가량을 남긴 것에 비해 1928년에는 60,300부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기는 했다. 그래도 여전히 구세군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갈 길이 바빴다. 그럴 때 새로 조선 구세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준섭 정령(Colonel, Joseph Barr)의 조선 사회를 보는 눈이 더해져서 모험 같은 자선냄비를 실행하게 된 것이었다.
1928년 6월 두영서 사령관의 승천 후 제6대 조선 구세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준섭 정령은 조선의 서대문과 종로거리를 오가다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 걸인들과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 하다가 잡혀 옥살이를 하다가 출소한 사람들이 오갈 데 없이 헤메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일제는 표면적으로 문화정치를 펼치면서 내면적으로는 ‘산미증산계획’과 ‘회사령철폐’를 통해 조선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박준섭 사령관은 부총독 이케가미(池上)와의 면담을 통해 구세군에서 이들을 구호하기 위해 몇몇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례적으로 우호적인 공감을 가질 뿐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1928년에는 흉년과 가뭄, 뒤늦게 쏟아 부은 홍수피해로 양곡추수가 실패한 해였을 뿐만 아니라, 그해 겨울은 1929년에 불어 닥칠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그로 인한 일제의 대륙침략의 조짐이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더욱 추웠다. 그래서 박준섭 사령관은 조선 구세군이 전례대로 해오던 ‘겨울구호’(Winter Relief)를 잘 알려진 세계구세군의 겨울구호방법인 ‘성탄자선냄비’를 설치해서 얼어붙은 조선을 해동시키기로 하였다. 그래서 박준섭 사령관은 당국의 승인을 얻어 1928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을 중심으로 15일부터 31일까지 20개소에서 최초의 자선냄비(慈善鍋)를 시작하였다. 조선 최초의 자선냄비의 모습을 표현한 구셰공보의 그림을 보면 조선 사회의 절박함을 사실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가운데 <救世軍慈善鍋>라는 만장이 걸린 삼각대에 솥을 건 그림이 있고, 그 오른쪽 상단에 “鍋가 出來”, 왼쪽에 “一萬人의 糧食衣服을要함 貴下의 喜捨金으로 불상한同胞가救濟됨니다”, 오른쪽 하단에 “지나시다가 喜捨하야주시기를 願함니다 朝鮮救世軍本營”이라고 적혀 있다. 그 그림의 제목은 「구졔동정금을거두선남비」였다.
3.3 첫 번째 자선냄비의 결과
위기의 구세군이 위기의 조선을 상대로 처음으로 행하는 자선냄비를 위해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리고 다 같이 협동하여 모금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선냄비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약 848엔 67전이었다. 이것으로 군국본영 옆에 <빈민무료음식소>를 차려 매일 120명에서 130명 정도의 걸인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제공해 주었는데, 매일 아침에 여러 가족이 쌀을 배급받아 집으로 가져가서 밥을 지을 수 있도록 했고, 쌀을 주어도 집이 없어서 밥을 지어먹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서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국밥을 끓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 수재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복과 음식과 연료 등을 지원했고 그들은 감사하게 받았다. 또한 구세군 사관들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경성 시내를 샅샅히 뒤져 병사(病死)하고 아사(餓死)한 부모 잃은 아이들을 찾아내어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육아원, 즉 혜천원(The Girl’s Home)과 후생학원(The Boy’s Home)에 보내고 그 아이들이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돌보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들을 위한 각 산업시설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숙소를 제공해 주었다.
3.4 우리 시대의 빨간 신호등 자선냄비
한국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이렇게 시작하여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조선 구세군의 가장 위기의 시대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구세군의 사회봉사정신을 발휘한 사건이었다. 그 이전에 비록 ‘겨울구호’라는 이름으로 사회봉사를 정기적으로 행하기는 했지만 1928년의 자선냄비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은 그 이후로 행해지는 매년의 자선냄비운동의 사회봉사정신이 조금씩 축척되어 한국사회의 모든 사회봉사의 가치와 신념과 신뢰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가치와 신념과 신뢰가 다음과 같이 「우리 시대의 빨간 신호등, 자선냄비」으로 표현되어졌다.
차디찬 거리에 종종 걸음이 바쁘게 흐르는데
빠알간 깃발 꽂아놓고,
무심한 이 시대를 그저 그렇게 떠나보낼 수 없어
그들의 작은 몸짓은 안타까이 하루를 붙잡아 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자화상을
시류에 떠내려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써봅니다.
하나둘 따스한 영혼들이 모이고 모이여
냄비에 불을 지피면
사랑의 온정이 조금씩 타올라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사랑잔치의 서곡이 연주되면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라며
등을 다독거립니다.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겨울 거리는
사랑으로 조금씩 데워져 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연약한 이들에게 희망의 불꽃으로 전해져
징그럽고 추운 인생의 겨울을 거뜬히 나게 하는 어머니가 됩니다.
딸랑딸랑 종소리는 어찌 그리도 청아한지
내가 살고 네가 우리가 함께 사는
비결이 이 냄비 안에 있음을
그는 그렇게 외쳐 됩니다.
자기 과시는 조금도 허락되지 않은 채
순수한 사랑 온도계가 알맞은 온도가 표시됩니다.
자선냄비 모금하는 그 현장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 웃으며 서 있습니다.
거기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사랑의 나침반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에게로 네가 나에게로 이르는
넉넉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소개하였던 김광진도 그 신념과 신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믿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몇 개나 되는 것일까.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뜬다는 것, 그런 것 외에 또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걸핏하면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지하철도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거대 기업의 비리이고, 서로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을 믿지 않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평화의 댐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방송사가 주관한 수재의연금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곤 할 때 우리의 마음들은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 가곤 했던가…… 믿을 수 있고, 가까이 하고 싶고, 소심한 생활을 하는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서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소년조선일보의 한 사설에서는 자선냄비를 통한 사회봉사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였다.
붉은색 자선냄비와 이를 알리는 맑은 종소리는 해마다 만나고 듣게 되는 것이지만 올해 2001년에는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가 점점 나아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사회 곳곳에는 따뜻한 보살핌과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부모를 잃은 채 살아가는 어린이, 돌봐줄 사람조차 없어 혼자 병과 싸우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떠도는 사람 등 외로움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함께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천해 나서는 일이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반드시 엄청나게 큰돈이나 많은 물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정성을 쏟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은 그들을 배려해주는 후원자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를 얻고 한결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다.
3.5 자선냄비 사회봉사의 정신
그렇다면 자선냄비의 어떤 사회봉사정신이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신념과 신뢰를 줄 수 있었을까?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피난 수도 부산에 자선냄비가 등장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귀다툼하며 생존 경쟁하던 그곳에서 6일 동안 놀랍게도 3,000환을 모금하였다. 그리고 휴전 후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환도한 서울에서 1953년 12월 자선냄비를 5군데서 실시하여 66,887환을 모금했다.
어쩌면 이때는 1928년 첫 자선냄비를 시작했던 그때보다 더 어려웠을 때였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 제 숟가락 하나 챙길 수도 없이 외국의 원조와 구호물자에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시기에 자선냄비 모금을 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나 어불성설이고 미친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세군의 사회봉사정신이 경제공황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고, 식민지 조선의 극악한 절명의 경제적 형편에서 시작되었듯이 어느 것 하나 거둘 수 없었던 전쟁의 끝자락에서 펼쳐진 자선냄비는 겉으로 드러내 보이려는 행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살아남기 위해 행해진 구원의 행진이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절제하고 절약하여 함께 살자는 것이 구세군의 사회봉사정신이었고, 그것이 서서히 한국의 인민들에게 신앙과 같이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가장 잘 발휘되었던 것이 1997년 IMF 사태 때였다.
캐럴조차 울리지 않는 세밑 거리,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몰고온 혹독한 겨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온정이 더욱 빛났다. 지난 4일 시작한 자선냄비 모금액이 22일까지 서울지역에서만 4억 4천여만 원, 작년 같은 기간 모금액 4억 1천여만 원보다 7.2%가 늘었다.
23일 오후 2시쯤 서울 명동 상업은행 앞 구세군 자선냄비, 한쪽 다리가 불편한 한 할머니가 손지갑을 한참 뒤적이더니 1백원짜리 동전을 6-7개 꺼냈다. 할머니는 4-5개는 자선냄비에, 2-3개는 바로 옆의 백혈병어린이돕기 성금함에 넣었다.
“내 어려우면 남도 어려운 법이지, 하물며 고아들이나 장애인들이 오죽하겠어.” 할머니는 “ 더 넣고 싶었지만 차비와 밥값을 빼니 그것밖에 안 된다”고 쑥스러워했다.
자선냄비를 지나쳐가다 다시 돌아선 30대 부부는 4-5세쯤 돼 보이는 아들 손에 3천원을 쥐어주며 넣게 했다.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자선냄비에 3만을 넣은 어떤 여인은 “식구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나왔는데 딸랑거리는 구세군 종소리를 지나치기가 죄스러웠다”고 했고, 6개월 동안 저금한 돼지 저금통을 통째로 들고 온 초등학생(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부서 회식을 나왔다가 회식비를 몽땅 넣은 회사원들(명동 상업은행 앞), 구세군 계좌로 160만원을 보낸 시민……”
IMF 때의 모금금액은 13억 4천 59만 1천 270원으로 예정액인 12억 원을 11.7% 초과한 액수이며 1996년의 12억 2천 458만 1천 862원보다 9%가량 증가한 것이었다. 구세군인 외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불황이 오고 한파가 오면 염려도 많다. 그러나 자선냄비는 사람들의 염려 이상으로 가득 채워진다. 구세군의 불황만은 허용할 수 없다는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난다. 종교적으로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일들이지만 사회적으로 겸손히 사랑의 손길이 넘쳤다고 할 수 있는, 구세군 자선냄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회봉사의 사회사적 진보의 결과이다. 그래서 김석태 부장은 “어려울수록 펄펄 끓는 자선냄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4. 날말 : 자선냄비 운동의 다양한 형태와 사회적 기대
냄비 하나 걸어 놓고 한 가지 형태로 시작했던 자선냄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IMF한파가 몰아닥쳤던 1998년 겨울에 차량이용자들이 쉽게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동서울, 동수원, 인천 등 4곳의 톨게이트에 자선냄비를 설치하여 모금하게 하였으며, 2000년 12월 4일부터 현대 사회 첨단문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과 결연하여 사이버 자선냄비(www.good-c.org)를 개설했다. 오프라인의 자선냄비가 연말연시에만 모금 활동을 벌인다면 온라인은 상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을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도 등장했다. JC엔터에인먼트의 온라인 게임 ‘조이시티(www.joycity.com)’ 는 2001년 1월까지 사이버 도시인 조이시티에 구세군 냄비를 마련하여 게이머들이 사이버머니를 구세군에 기부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민은행과 한빛은행과 농협 등 전국의 9개 은행과 손잡고 ‘2000원의 사랑’ 자동이체 캠페인을 벌였으며. 2002년에는 국민, 농협, 서울, 신한, 우체국, 외환, 한빛은행에 ‘온라인 자선냄비(www.salvationarm.or.kr)’을 개설하여 연말까지 모금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는 서울시 교통카드사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단말기를 이용해 1회에 1천 원씩 기부할 수 있는 ‘티-머니 구세군 자선냄비’를 개설하였고, 부산에서도 ‘디지털 구세군 자선냄비’를 개설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06년에는 신용카드에 쌓인 적립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12월 1일에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구세군과 함께 ‘사랑의 모금행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 고객에게 까페라떼 등 음료를 공짜로 준다고 밝혔고, 2007년부터는 회사의 현관에 설치한 크리스마스트리 옆에 자선냄비를 놓자는 한 사관의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거리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회사와 직원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1000여개의 자선냄비를 새로 제작하여 비치하였고, 그 해 가을에는 철 이른 자선냄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안에 울려 퍼졌는데, 현대백화점이 구세군과 함께 ‘북한 수재민 돕기 자선냄비’ 행사를 전국 11개의 점포에서 진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특별콘서트가 세종로 동아미디어 광화문 사옥 앞에서 열렸다. 구세군이 기획한 것이 아니라 피엠씨프러덕션이라는 회사에서 구세군의 자선냄비를 격려하기 위해 자체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다. ‘난타’ 배우들이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얇은 옷을 입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자선냄비가 현대 사회의 문화와 기업들의 협조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자선냄비를 통한 구세군 사회봉사 정신이 종교사회학적 상징의 기능과 가치와 신념을 상실하지 않고 잘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회는 구세군에게 무한한 존경심과 신뢰감을 보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구세군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래 전에 어느 대학의 교수가 한국의 사회복지사업을 평가하는 중에 구세군을 가리켜 “작은 거인”이라고 했고, 지금은 한일장신대의 총장이신 정장복 교수도 한국 구세군을 가리켜 “한국교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언급한바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구세군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신력을 대변해 주는 말이다. 이러한 평가를 얻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구세군의 역할은 인고(忍苦)로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위기의 시기에 경제공황과 전쟁도 불사한 극악한 공포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구세군으로서 해야 할 바를 묵묵히 행함으로 얻은 평가이다.
한국 구세군의 자선냄비 어느 새 80년을 뛰어 넘어 상수(上壽)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 동안 이 자선냄비 안에 수천, 수억 천사들의 사랑이 담겨지고 나누어졌다.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선냄비를 위해서라면 내 일같이 협력해 주고 있다. 자선냄비가 행해지는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고 쉼터가 제공 되어지는 곳도 있다. 길가다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다 주며 격려하시는 시민도 있고, 빈말이 아닌 ‘추운데 수고하십니다’ 인사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성실히 자선냄비에 관한 반대 의견을 달아주시는 안티 세력들도 있다. 이 모두가 구세군 자선냄비에 대한 사회적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선냄비는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모든 사회적 기대에 겸손히 응답하고 더 성실히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날씨…… 온정 쌓이는 자선냄비, 전국이 대체로 맑고 구름이 끼겠다……”, “오늘의 날씨…… 자선냄비에 수북한 情, 전국이 흐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는 일기예보처럼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도움 받은 글들
구셰신문
구세군연역 정리중
국민일보
뉴스 앤 조이
東亞日報
사령관일지
소년조선일보
朝鮮日報
The War Cry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김준철. 한국 구세군 100년사. 서울: 구세군출판부, 2008.
송찬섭, 홍순권. 한국사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양춘 외. 사회학개론. 서울: 진성사, 198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 서울: 기독교문사, 1991.
康敬瑗. 「영국 綿織物노동자들의 차티스트(Chartist)운동: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啓明大學校 大學院 歷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3.
강종권. 「일제시대 ‘기독교사회주의’ 연구.」 숭실대학교기독교학대학원 기독교사회학과 석사 학위논문, 2005.
高源相. 「美國 革新主義運動에 關한 硏究:社會福音主義를 中心으로.」 高麗大學校敎育大學院 歷史敎育專攻, 1989.
羅貞淑. 「1920年代 植民地 農業政策과 植民層分解 硏究: 産米增殖 計劃을 中心으로.」 建國大 學校敎育大學院 敎育學科 歷史敎育專攻 碩士學位論文, 1989.
박영신. 「사회운동의 역동구조: 상징, 지식, 실행.」 사회이론. 2006년 가을/겨울호.
Harrison, J. F. C. Harrison. 영국민중사. 이영석 옮김. 서울: 소나무, 1989.
Maurois, Andre. 미국사. 서울: 기린원, 1988.
Waldron, John D. 엮음. 사회봉사신학. 구세군대한본영, 2000.
Horton, Paul B. and Hunt, Chester L., Sociology. New York: McGraw-Hill, 1984.
Niebuhr, H. Richard.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Publishers, 1956.
Raven, C. E. Raven. Christian Socialism 1848-1854. London: Macmillan, 1920.
Sandall, Robert. The History of the Salvation Army. Vol, Ⅲ. Social Reform and Welfare Work, London and Edinburgh: The Salvation Army New York, 1979.
Smucker, Donovan E. “Walter Rauschenbusch Story.” Foundations. Feb,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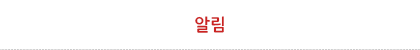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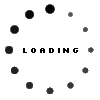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