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인천에 사는 동생과 함께 일이 있어 집을 나선 길이었다 신호등에 걸려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 길가에서 붕어빵을 굽는 천막(?)이 있었다. 시간이 오후5시를 조금 넘어 선 때라 슬쩍 구미가 당겼다. 그 때 동생이 왈, " 아유, 저거 사야되는데 저쪽이라 안되겠네" 차에서 내려 그것을 살 형편이 안되었다.
"좀 더 가봐, 또 있겠지" " 언니, 요새 먹을 거는 저것밖에 없다. 진짜야 언니" 동생은 힘주어 말했고 왠지 말도 안되는 것 같은 동생의 말에 나도 " 그래. 맞어." 를 연발하며 입 속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단팟의 맛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 날, 붕어빵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않았다. 일을 다 마치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돌아 오는 길가에 또 다른 붕어빵 천막 앞에 과외를 마치고 집에 가는길인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대여섯명이 맛있게 여러가지를 먹고있었다.
기회만 있으면 사려고 했던 붕어빵이지만, 지금은 아니올시다였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세상을 다 가져도 하루 밥세끼 더 먹고 사냐?' 하시던 말들이 떠 올랐다. 사실, 옛날에 그렇게 맛있던 음식들이 생각나서 똑 같이 해 먹어보지만, 영 그때 그맛이 아님을 우리는 매일 실감하면서 산다. 속이 주홍빛 나는 호박을 쭉 쭉 썰어넣고 배추 줄기채 담은 호박김치를 푹푹 지져서 먹을 라치면, 정말로 영혼까지 만족스러웠던 그 맛이 있었다.
먹는 것도 체질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20세가 훨씬 넘도록 편식만했었다. 물론 지금처럼 풍부한 중에 골라 먹는 편식이 아니라, 늘 있던 것만을 먹다보니 다른 것에는 익숙치를 못해서였을 것이다. 그래도 싫은 것은 아주 싫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 물건들이었다.(지금은 없어서 못먹지만). 아버지께서 몸이 약하신편이라 한달에도 몇번 씩은 고기를 먹었고 내륙지방이었지만, 가끔은 생선도 상에 올라왔었다.
그런데 나는 웬일인지 생선 냄새만 나면, 영 밥맛이 떨어졌던 것 같다. 그 비리꾸레한 냄새가 왠지 청결치 못한 것 같아 아예 생선은 입에도 안댔던 기억이 있다. 그런 괴벽이 고쳐진 곳이 바로 구세군 사관학교였다. 1969년, 사관학교의 음식은 어려웠던 시절에 비해 정말 괞찮았다. (이 글을 우리 동기들이 읽는다면 항의가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겨울 밤에 몰래 돼지고기를 사다가 삶았는지 구었는지 사관학생들 몇명이 김치독에서 묵은 김치 꺼내다가 방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교관님에게 들켜 치도고니를 맞은 일이 있으니까, 물론 나는 모범생답게 그 대열에 끼진 않았지만, 김민제 사관님은 분명히 그 범인 중의 하나였다.)
무엇보다도 매번 메뉴가 바뀌는 게 좋았다. 물론,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것이긴 했어도, 따지고보면 지금처럼 음식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정도로도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이러한 나의 음식에 대한 적응성은 가히 어려서부터이다. 나는 지금도 김치를 제외한 3가지만 있다면 별 어려움 없이 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나이가 있고 20대 이후 안 먹는 것 없이 두루 다 먹어치우다보니 옛날 같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아직 그렇다. 그 서너가지는 바로 콩나물, 오이. 김. 그리고 김치이다. 지금도 식료품을 살라치면 나도 모르게 영락없이 손에 잡는게 이 몇가지이다. 오이로 말할라치면, 계절따라 다른데 특히 여름날, 하얗고 꼬들꼬들한 찬밥에 얼음 냉수를 붓고 짭잘하게 우러난 아작아작한 오이지를 올려놓고 씹는 낱알의 달콤함과 시원함이란 상상만 해도 정말 즐겁다.
김에 대한 추억은 내 한평생을 가고도 남는다. 자그마치 딸만 여덟, 둥그런 밥상에 엄마와 아빠와 둘러 앉아 밥을 먹었다. 어떤 동생은 맛있는 것을 먼저 먹어치우기도 했고 유난히도 밥을 늦게까지 먹었던 나는 제대로 반찬을 챙겨먹지도 못한 것 같다. 그나마 영원히 내편이 되어 주는 김치가 있었기에 그런대로 행복했었다. 그런데 한달에 두어차례, 엄마가 들기름에 김을 바르는 날이면, 내 후각과 시각은 조금 달라졌다. 지금같아도 그랬으리라. 엄마는 잘 바른 김을 반듯하게 잘라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10장씩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구수한 들기름 내음이 따뜻한 밥 위에서 나를 유혹한다. 한 장 한장 없어지는 김이 너무도 아깝고 아쉬워서 다른 반찬을 섞어 먹어가며 그것도 반조각씩 잘라서 야금야금 먹던 기억이있다. 그런데 같은 형제라도 그렇게 다를까! 내 밑의 동생은 후닥딱 밥 열숟가락에 김을 다 날려버린다. 그리고는 바로 옆의 내 밥그릇을 힐끔거린다. 그러면, 엄마는 슬쩍 한 두장을 걔 밥위에 얹어준다. 이것은 언제나 똑 같이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결국 나는 아껴서 먹다가 뭘 그렇게 아끼냐고 되레 야단만 맞은 기억이 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안달스러운게 바로 내 성격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때, 내가 한 생각! " 언제 그 맛있는 김을 한번 실컷 먹어보나"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룬지도 꽤 오래된다. 아니 그 보다 더 컸던 소원도 많이 이루어주셨다. 그래도 오늘까지 나에겐 크고 작은 바램과 소원이 있다. 감사한 것은 그 바램과 소원들이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내 마음이 머물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부족하지만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한다. 비록 길거리에서 1,000원에 몇개씩 하는 붕어빵을 사 먹지만, 그것의 맛이 옛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에 감사하고, 들기름에 살짝 볶아 낸, 아작아작한 콩나물과 싱싱한 오이의 내음, 그리고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나를 지켜 줄 한국의 맛, 김치를 사랑하면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히 허락하시는 내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FOR YOUR GRACE FOR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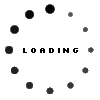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