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참으로 오랫만에 내 8자매중 한명을 제한 7명의 동생들과 엄마가 한 자리에 모인 일이 있었다. 합해서 8명의 나들이.
자그마치 86세 되신 엄마로 부터 46살이 되는 막내까지 그야말로 세대차이를 절감하게 하는 만남이었다. 밤을 새우며 지난 이야기, 시집와서 겪은 며느리로서의 이야기,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로서의 이야기, 지아비들을 모시는 아내로서의 이야기 또 빼놓을 수 없는 교회이야기 등으로 울고, 웃으며 시원하게 가슴을 비운 시간들이었다. 어느새 40대를 넘어 5,60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생명줄로 알고 몰입했던 가정과 자녀들에게서 한발 스르르 물러서는 입장이 되고보니 아마도 이런 여유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었다.
재미난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한가지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 어려서 부터 같은 밥상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자랐지만, 수십년이 지난 오늘 그 입맛을 맞추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것을 실감한 기회였다. 아침부터 평소에 안 먹던 밥을 점심까지 푸짐하게 먹다 보니 모두가 저녁은 좀 색다르게 그리고도 간단하게 먹고 싶은 바램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각기 낯선 곳 제주의 한 시가지에서 음식사냥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선 불빛이 환한 간판부터 20개가 넘는 눈들이 재빠른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그런데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돈씨종류이고 정통 한식간판들이었다. 그러지않아도 이틀째 쌀밥을 먹은 나는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속이 미식미식 할정도로 칼큼한 그 무엇이 생각났다. 그러자 바로 코 앞에 눈에 띄는 빨간 간판 바로 중화요리집! 평소엔 니글거리던 그 간판 속에서 매콤한 짬뽕 국물이 내 입맛을 유혹했다.
동생들은 아직도 맛사냥을 하고있고, 몸이 지친 엄마는 아무데고 들어가자고 보채시고, 옆에 있던 셋째에게 이리로 들어가자는 눈짓을 했다. 짬뽕제의에 일단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 평소에 국수한그릇을 먹어도 분위기 찾던 중년여인들의 눈에 그 분위기가 만족스러울리가 없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 예정된 프로그램이 있어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길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냥 뱃속을 비워 놓는 것이 제일 좋은 결론이 되는 상황이었다.
일단, 자리를 잡고 모두를 불러들였다. 그런데 나와 셋째만 가지고는 일이 성사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제각기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구체적인 메뉴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 식당에 다른 손님이 없어서인지 이건 그야말로 왁자지껄, 시끌벅적 평소에 교회에서 상냥하고 나긋나긋하던 사모님들이나 단장님들이나 집사들의 모습은 간 곳없고 제각기 독불장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몇명이 밖으로 슬쩍 빠져나갔다. 더 좋은 그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재미있었고, 어쩌면 한 핏줄을 타고 났으면서도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 그 위에 이 세상에 하나뿐인 독특함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신묘막측한 창조의 섭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느낀 즐거운 시간이었다.
결국, 막내 특유의 카리스마로 모두를 휘어잡았다. 언제고 이런 소용돌이가 있으면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은 막내차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더 이상 시끄러울 수가 없다. ( 막내야. 명심해라. 니기 잘나서가 아니라 언니들이 봐주는 거라는 걸. 허긴 니가 그걸 모르고 덤비면 그냥 놔둘 우리도 아니지만). 결국 막내 특유의 칼을 휘둘르기 시작. 모두를 불러들이고 음식 메뉴를 정한다. 엄마와 위의 언니들만 빼고는 모두 호칭이 '너'다. 결국 시퍼런 막내의 서슬에 잡혀 꼼짝 못하고 음식을 주문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 날, 그 집에서 먹은 탕수육과 물만두, 그리고 짬뽕과 자장면은 내 생애 먹어본 중국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었다.
사연을 알고보니 요리사가 총각인데 얼마 전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COOK'으로 있다가 개업을 해서 차린 집이란다. 거기다 곁드린 새큼한 깍두기의 맛은 온종일 피곤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든 활력소와 같았다.
음식점을 나오며 유난히도 밝게 빛나는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좋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 같은 사람이 없는 독특한 존재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분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만 하겠다는 책임감을 느낀 아름다운 제주에서의 한 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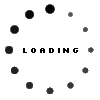
댓글0개